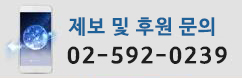호남 정맥의 끝부분인 순천시에 높이 솟은 전형적인 토산(土山)인 조계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송광사와 선암사를 통틀어 전남도가 명승 제 8호로 선정한 명소로서 부드럽고 덕성스럽다. 우리나라, 삼보(三寶) 사찰 가운데 하나인 승보(僧寶) 송광사는 180여 년 동안 16명의 국사를 배출하였고 선교(禪敎) 종찰인 선암사는 보물 400호로 지정된 승선교(昇仙矯)가 있고 3백년 된 산철쭉과 연산홍, 왕벚꽃을 비롯한 야생화가 많은 사찰을 동서 산자락에 앉히고 위용을 자랑하는 전남의 명산이다.
선암사에서 등정길을 잡았다.(12시) 선암사천을 끼고 양쪽변에 수림이 꽉찬 넓은 도로 다리 밑으로 힘차게 흐르는 물소리도 봄빛에 맞장구로 화답해 생동감이 넘친다.어느새 사찰 일주문(一柱門)으로 들어섰다. 전남유형문화재 제 96호로 지정된 일주문은 누문(樓門)인 강선루를 지나 처음 들어서는 문이다. 단층 맞배기와집으로 외 4출목, 내 2출목의 다포식 건축이다. 본래 선암사는 백제 성왕 7년(529) 아도화상이 개산(開山)하여 비로암이라 하였고 그 후 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창건하여 선암사라 일컬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한국불료 태고종 총무원이기도 하다.

사찰 내에 들어섰다. 팔상전, 대웅전, 원통전, 불조전 등 건물을 비롯해 수백 년 된 매화나무 수십 그루와 영산홍 등이 울타리를 쳐 놓았고 은은히 퍼지는 목탁소리는 불심을 깨워주고 봄을 기다렸다는 듯 만개한 벚꽃은 세속에 찌든 머리 속을 이내 정화시킨다. 사찰을 나와 뒤쪽 서쪽으로 돌아가자 열린 산행로 나무가지에 리본들이 매달려 형형색색으로 산행 길잡이 노릇을 한다. 이곳에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12/20)
대각암을 지나 다시 서편으로 돌자 나무마다 새싹이 돋아 청초한 숲을 만들어 놓았고 그 속에는 봄향기가 가득했다. 겨우내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움이 튼 수줍은 새순들은 산자락을 포근하게 감싸고, 산세도 부드럽고 아늑하며 산로도 완만한 편이다. 싱그러운 봄빛을 안고 산비탈 모퉁이로 돌아서자 30m나 되는 수백 년 된 거대한 고사목이 길목에 휘어져 누워있는 운치가 한층 돋보인다. 바람마저 잠이 들어 고요한 산속은,정결하고 차분한 마음가짐을 다지게 한다. 올망졸망한 산길로 세상사를 잊고 가다보니 어느새 소장군봉에 닿았다. 이곳에서 활처럼 굽은 오솔길을 계속 오르니 향로암터가 나온다(2/55)

쉼터로 나무그늘이 좋았다. 솔솔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피로를 잠재운다.사지는 축대만 흔적을 남겼을 뿐 주위에 무성한 잡초만이 자라 쓸쓸했다.가뭄으로 샘터도 물이 말라 갈증의 허덕임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 휴식을 취한 다음 산정으로 가파른 길은 로프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곳부터는 진달래꽃이 무리지어 만개하였다. 미소 짓는 앳된 모습은 수줍은 소녀처럼 해맑아 보인다. 산정이 확 트인 바위봉이다.(2/30)
송광면과 주암면이 접한 곳이다. 산 아래는 장목골과 피아골이 협곡을 이루고 건너편 서북쪽으로는 범바위, 856봉, 연산봉과 시루봉, 786봉이 일렬로 늘어섰고 멀리 무등,광양 백운산,모후(母后) 지리산맥이 넘실댄다.
멀리 행정저수지가 봄빛을 받아 은빛을 발산하는 모습이 찬란하다. 양자락에 대가람을 안고 있어서인지 덕성스럽고 자비가 넘치는 부드러운 조계산의 모습을 이곳에서 읽게 된다. 원래는 연산봉(蓮山 峰 851m)을 중심으로 한 서쪽을 송광산이라 하고 장군봉을 주봉으로 한 동쪽을 조계산이라 했다. 송광사를 지으면서 산 이름을 딴 것인데, 고려 희종이 어필로 조계산이라 이름을 하사하여 산 명이 개칭되었다 한다. 고산지대로 산정은 봄보다는 겨울 쪽에 더 가까운 편이라 하겠다. 산자락과는 많은 차이를 가진다. 나무가지는 새싹이 아닌 마른 잎 그대로이다. 산정에서 즐기던 시간도 잠깐, 나래를 접었다. 북쪽 능선을 타고 연산봉으로 향했다.(2/45)
폭신폭신한 능선길은 차라리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았다. 돌멩이 하나 없는 솜털 같은 부드러운 흙은 어느 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단길이다. 마음껏 달릴 수 있고 오르락내리락 고개를 넘는 재미에 흠뻑 젖었다. 우뚝 선 범바위를 지나 856봉 아래 장막골 쪽은 거대한 억새밭을 이룬 초원지대이다. 가을이면 이 일대는 은빛 초원으로 장관이다. 산죽이 군락을 이뤄 무성한 터널을 이룬다. 다시 참나무와 싸리나무길이 이어지고 길옆에 핀 야생화의 방긋 웃는 미소에 발길이 가볍다. 특히 얼레지꽃은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끝없이 길목을 지키며 길손을 반겨줘 산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작은 봉우리를 넘고 넘어 사거리를 지나 연산봉에 닿았다.(4/35)
병풍처럼 둘러친 조계산의 능선을 한눈에 바라보는 조망이야 말로 일품이다. 연화봉 헬기장을 지나 곤두박질쳐 송광 굴목이재 십자로에 도착했다.(4시)
산정에서 이곳까지 얼마나 줄달음질쳤는지 온몸은 비를 맞은 것처럼 흠뻑 젖었다. 송광사를 2km 앞둔 굴목이재의 쉼터는 산꾼들에게 는 더없는 휴식처로 숨을 돌렸다.우측으로 돌면 송광사로 가는 하산길이고 좌측은 선암자골 가는 길이다.
재를 넘어 직진한다. 천자암봉(755m)을 향해 가파른 길을 수림을 헤쳐 오름길을 친다.이내 땀방울이 얼굴을 가린다.이윽고 천자암봉에 올라 숨을 한번 고르고 내리막길을 달려 천자암에 닿았다.(4/30)

천자암은 송광사의 부속암으로 뒷뜰에 유명한 두 그루 향나무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붙인 이름이 쌍향나무인데 수령이 약 8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12.5m이며 천연 기념물 88호로 지정되었다. 송광사가 자랑하는 3가지의 명물 중 하나로 나무전체가 숫자만큼이나 엿가락처럼 꼬였고 가지가 모두 땅을 향하고 있는 신기한 나무다. 보조국사 지눌과 당나라 담당 왕자가 송광사 천자암에 이르러 짚던 지팡이를 꽂았더니 가지가 나고 잎이 피었다고 한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는 천연기념물(나무) 중 가장 기이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단 뜻도 될 것이다.또 경이스러운 이 쌍향나무를 만지면 극락에 간다는 속설이 있는데 천 번을 보고 천 번의 기도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천자암에 삼배만 한다면 송광사에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이용할 수 있고 조계산 8부 능선에 있다.)
참배를 마치고 천자암을 나와 인구재를 넘어 너드럼골에 접어들었다. 우거진 수목들이 봄빛을 받아 윤기가 나고 계곡의 물소리는 힘찬 행진곡으로 들린다. 소(沼)에는 떨어진 벚꽃잎이 가득 덮여 새로운 풍광을 보게 된다.
울창한 숲속을 지나 송광사에 도착했다.(오후 6시) 저녁법회가 막 시작되는 순간이다. 승들이 법고를 치고, 목탁소리, 염불소리는 온산을 메아리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심의 세계로 빠져든다. 사찰경 내는 불제자들로 붐벼 대가람임을 실감케 된다.

국보 3점, 보물 12점, 지방문화재 11점, 천연기념물 1점 등 많은 불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도원으로서 정신문화를 꽃피우고 있다. 불멸의 명산 조계산의 산행도 송광사를 끝으로 오늘의 여정을 마감하게 된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